강민지/SK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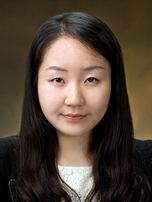
사보편집기자
지성인이라 불리던 대학생의 상징이 팔에 낀 시집과 소설책에서 자격증과 어학 점수로 바뀐 지도 꽤 됐다. 지성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원하는 사회에서 문학은 쇠퇴하고 읽을 만한 글은 줄어간다는데, 진입장벽은 낮아져서 요즘엔 유명세만 있으면 책을 낸다. 이렇게 글만 써서 밥벌어먹기는 더욱 힘들어지는 와중에도, 예술이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시각 때문인지, 그저 악한 관행의 세습인지 여전히 ‘돈 받고 글 쓰는’ 바닥에서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많은 작가 지망생들의 콘텐츠를 착취하는 사례는 여전히 횡행한다. 비단 문학계에서의 일만은 아니다. 많은 시나리오 작가들은 투자와 흥행 등의 문제로 인해 시나리오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작가는 굶주림으로 죽고, 어떤 작가는 본인은 선인세 받고 출판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부조리 속에 가난이 예술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던진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계약과 그 이행에 의해 돌아간다는 근본적인 원리가 통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 먹고살기 어려울 줄 알면서도 예술의 길을 택한 고매한 영혼들만의 고뇌가 아니다. 사회에는 단순 노동이라고 해서 대충 했다간 신체가 훼손될 수도 있는 고된 일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창작이라는 작업도 대우가 박하다고 해서 대충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난한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과 농성, 파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문제라고 여기면서, 노조를 결성할 소속도 없는 이들의 창작이라는 노동의 대가 지급 문제에 대해서 사회는 너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닐까.
졸업 직후 패션지의 어시스턴트로 일할 기회가 있었다. 매일 출근할 필요는 없고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오라’는 조건이 내걸린 그 일의 임금은 ‘건당 오만 원’이었다. 객지에서 한 달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신입 공채도 잘 없는 그 바닥에서 에디터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나마 높은 어시스턴트 일을 하고픈 이들은 줄을 섰으니, 최저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든 개선되지 않는 악행으로 남을 일이다.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니며 고용보험도 없는, 근로자라 부르기도 뭣한 필요할 때만 부리는 ‘일꾼’이므로.
글 쓰는 직업과 돈 잘 버는 직업이 양자택일 사항인 나라에서 글로 밥 벌어 먹는 꿈을 꾸는 것은 포기할까 하고, ‘블로그에 올리는 일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나’ 싶었더니, 내 블로그엔 도통 방문하는 이가 없었다. 파워블로거가 되는 일에도 역시 금전적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있었다. 글로 관심 받고 싶으면 연예인이 되어 트위터를 하는 길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던 우스갯소리가 정답인가 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