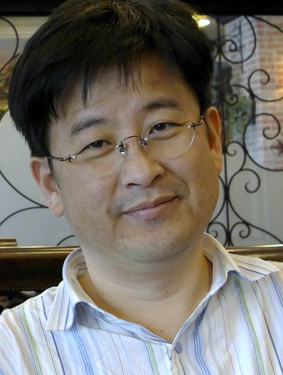
설은 우리의 대표적 문화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강제로 생성된 것도 아니다. 긴 시간 동안 비에 바위가 깍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 나무가 자라듯이 설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 십년 동안 멀미가 날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다. 먹는 것, 입는것 , 그리고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굳이 나열 할 필요도 없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외식 메뉴, 아이들의 물들인 머리와 이해가 가지 않는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불과 삼여년 전만 해도 볼 수 없던 풍경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 하게도 설날의 귀향 문화만큼은 변함이 없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는 정체가 되고 있다는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인의 고향 문화와 귀성 문화는 유전자에 새겨진 게 아니가 하는 엉뚱한 발상을 해본다. 모르긴 해도 DNA에 후천적으로 문화가 기록되어 유전될 수 있다면 틀림없이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설이라는 항목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설과 고향은 눈물이요. 그리움의 원천이다. 필자는 아직도 명절에 고향을 가지 못하면 슬퍼진다. 고향 갈 날짜를 받아 놓으면 가슴이 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다. 고향에 슬픈일이라도 생기고 가보지 못하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고향 사람을 만나면 한동안 주삣거린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급속하게 변하고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한국인 답게 하는 문화를 들어 보라면 필자는 고향과 설, 추석 문화를 꼽고 싶다. 굳이 서양 문화에서 이에 상응할 것를 찾자면 크리스마스와 추수 감사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크리스마스가 되더라도 설이나 추석 같은 느낌을 가지지는 않는다. 물론 필자만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이든 한국인들의 보편적 정서일 것이다.
필자는 고향과 설, 추석 명절이 가지는 외형적 모습보다는 정서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라 흰눈과 산타 크로스 복장만 보아도 마음이 포근해진다. 크리스마스의 생성 과정이 어쨌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느낌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도 그 보다 훨씬 훌륭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를 가득 메운 차들을 보라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노령화와 다문화 가정이다. 가까운 시간 안에 이 두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다.
필자는 설과 고향 문화가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서적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은 살아있는 고향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고향이 된다. 어쩌면 명절에 돌아가는 귀향 행렬은 그리움의 행렬일지도 모르겠다. 고향처럼 사람을 그리워 보자. 겸손해지고 아름다워지리라.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